카자흐스탄 전역에서 고아 및 보호자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제도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sozmedia.kz 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20개 지역에서 360명 이상의 시민들이 멘토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아동의 사회화와 자립 준비를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멘토링 제도는 10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고아 아동 보호 기관에 소속된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에 진출하기까지의 과정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멘토들은 무보수로 활동하며, 아동에게 정서적 지지와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카자흐스탄 법무부 산하 아동 권리 보호 위원회 위원장 나심잔 오스파노바는 멘토링 제도의 핵심은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정서적 교감과 책임감 있는 동행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멘토는 아이 곁에 있는 어른이 아니라, 시간과 경험,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존재이며,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책임감이 있어야만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정부가 교육과 자격 인증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sozmedia.kz는 전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멘토링 제도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 교육과 인증 제도를 도입했다. 멘토로 활동하고자 하는 시민은 관련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멘토들이 아동 지원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제도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멘토링 제도는 2024년부터 법제화되어 시행 중이며, 아동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회적 기반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sozmedia.kz는 보도했다.
다만, 멘토링 제도가 모든 아동에게 동일한 효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멘토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아동 1인당 멘토 배정이 지연되거나, 멘토의 지속적인 활동이 어려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도의 안정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멘토의 역량 관리뿐 아니라, 아동과의 관계 형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부담이나 기대 격차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편집자 주]
본 기사에서는 ‘요보호아동’ 대신 ‘고아’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는 한국의 당사자 단체인 ‘고아권익연대’가 시설에서 자란 아동의 정체성과 현실을 보다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고아’라는 용어 사용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단체는 ‘요보호아동’이라는 표현이 아동의 삶과 상처를 뭉뚱그려 숨기며, 오히려 사회적 인식 개선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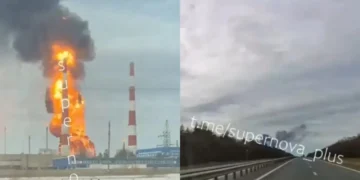

![📌 [포토단신] 천산 자락에서 쉼을 찾는 사람들, 천산산악회 10월 월례회 개최](https://kazkorean.kz/wp-content/uploads/2025/10/20251018_1954111024-576사이즈-360x180.jpg)
![📌 [포토단신] 중소기업연합회 10월 월례회 개최](https://kazkorean.kz/wp-content/uploads/2025/10/중소기업연합회중기연-2025년-10월-월례회-360x18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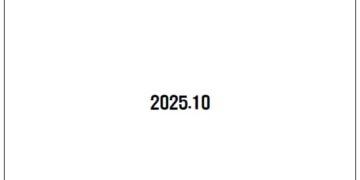









![[단신] 2025년 9월 1일부터 카자흐스탄에서 바뀌는 것들](https://kazkorean.kz/wp-content/uploads/2025/08/카자흐스탄에서-2025년-9월-1일부터-바뀌는-것들-360x180.we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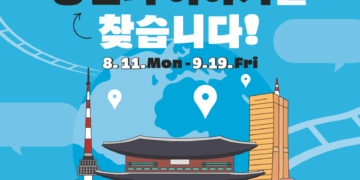

![[인터뷰] 김대영 오픈헬스케어 카자흐스탄 법인대표](https://kazkorean.kz/wp-content/uploads/2025/10/김대영-오픈헬스케어-법인-대표-360x18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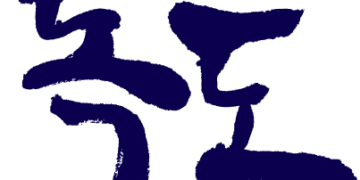





![[주택 매매] 실거주 또는 투자 추천 128평](https://kazkorean.kz/wp-content/uploads/2025/07/부동산_주택-128평-3-360x180.jpeg)


![쿠쿠 전기밥솥[판매완료]](https://kazkorean.kz/wp-content/uploads/2025/07/쿠쿠전기밥솥-360x18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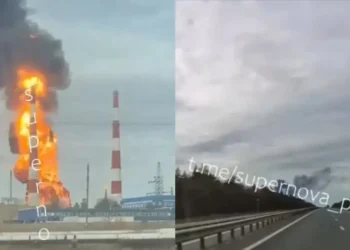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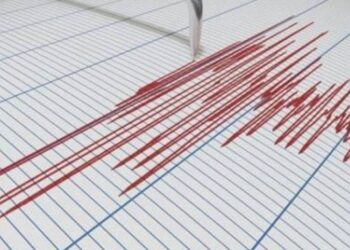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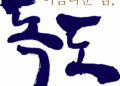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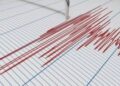
카자흐스탄 전역에서 확대되고 있는 멘토링 제도는 고아 및 보호자 없는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정서적 지지와 자립 준비를 제공하는 매우 의미 있는 사회적 노력이라 생각합니다. 360여 명의 시민들이 무보수로 참여하며 아이들과 교감하고 있다는 점은 공동체의 따뜻한 책임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정부가 교육과 인증 제도를 도입해 멘토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은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방향입니다.
잘 운영되면 좋겠네요..
빈부격차가 매우 심하고,
지방으로 갈수록 이혼율이나
자녀를 방치하고 버리는 가정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카자흐스탄 정부가 앞장서서 관리하고
더 많은 고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회복지 단체들이 형성되어서
가난하고 버림받은 고아들을 돌아보는,
발전하는 카자흐스탄이 되면 좋겠습니다.
편집자님의 담긴 글을 보고 생각이 깊어집니다…
“고아”, “요 보호 아동”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사용했던 단어인데……
명확하면서도 그들의 정체성을 표현하며
그러나, 좀 더 아름답게 사용되어 질 수 있는 단어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모색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